- ‘시라트’는 스페인 영화로,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사운드트랙상을 수상했다.
- 올리버 라세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로, 그가 연출한 장편 4편 모두가 칸 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다.
- 1월 21일 개봉해, CGV 아트하우스를 포함한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시라트> 리뷰

보통 각종 영화제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인사는 간결하다. “봤냐”, “봐라” 혹은 “보지 마라”.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안부 인사는 단연 <시라트>였다. 극호를 외쳤던 대부분은 열광을 공유하고 싶어 안달이었고, 불호를 외치는 소수는 어쩐지 화가 나 있었다. 평소라면 소문난 잔치의 차림표를 따지거나 점잖게 노코멘트 정도로 즉답을 피했을 이들조차 뚜렷한 자기 입장을 피력했다. 중간이 없었다.
게다가 환호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진저리를 치는 이들조차 ‘일단 볼 것’을 추천했다. 좋아하는 작품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화를 내면서도 영화를 보고 자신의 분노에 공감해달라는 주문은 처음이었다. ‘반드시 극장에서 보라’는 당부도 매번 들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시라트>가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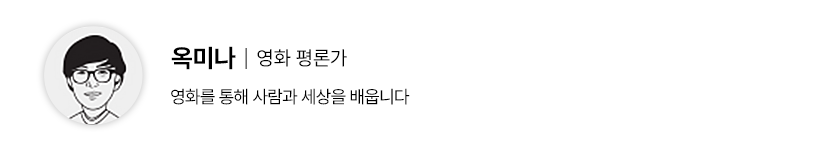
‘시라트’는 아랍어로 ‘다리’ 혹은 ‘길’을 의미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승과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로 설명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우며 불보다 뜨거운데, 다리 아래에는 지옥 구덩이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자는 쉽게 재빨리 건널 수 있지만 혹자는 어려움을 겪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종교나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선악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시라트>에서 인물들의 운명은 종교나 신앙, 선악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지 않다.

영화는 검은 스피커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손으로 시작한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자연 풍광 맞은편에 일렬로 놓인 야외용 스피커들은, 신이 창조한 위대한 세계 속에 좀 생뚱맞게 우뚝한 인공물 같다. 그 스피커 앞에는 테크노 사운드에 맞춰 춤추는 레이버들이 있다. 레이버들을 눈여겨보자.
실종된 딸을 찾는 루이스(세르지 로페즈)의 여정을 서사의 중심에 놓으면 이 잔혹한 사막의 로드 무비는 좌절과 실패의 비논리적인 나열로 납작해진다. 하지만, 레이빙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연한 방문자, 거북한 얼굴의 관찰자였던 루이스가 마침내 레이빙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순간이 서사의 변곡점에 놓인다.

매켄지 워크에 따르면 레이빙의 본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을 견디게 도와주는 집단적 실천’이다. (상실의 고통에 울부짖는 루이스에게 레이빙을 권하는 이들을 떠올려 보자) 레이버는 테크노 사운드가 신체를 투과할 때, ‘몸과 정신이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는 해리의 순간’을 경험한다.
그/그녀가 속한 세계 혹은 자신의 몸을 견딜 수 없는 이들에게 레이빙은 해방이자 의례이며, 구원이자 중독이다. 그것이 남은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연명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몸을 벗어날 수 있는’ 레이빙은 더 각별하다. 스피커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동등해진 이들은 정화와 교감, 연결과 소통을 경험한다. 파편화된 스피커의 이미지는 영화 전반에 자주 출몰한다. TV 화면 속 메카의 검은 돌을 에워싼 순례자들의 행렬은 행사용 야외 스피커를 둘러싼 레이버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종교와 레이빙이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 <시라트>의 스피커라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놀리스와 나란히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라트>에서 레이빙만큼 중요한 소재는 죽음이다. 죽음은 (여타 영화들과 달리) 징조나 조짐, 서사의 복선 없이 돌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며, (현실이 그러하듯) 인과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우연의 세계에 속해 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은 ‘왜 하필 여기 와서’ 같은 한탄으로 죽음의 공포는 희석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무탈한 삶이 우연과 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에게 죽음은 의자 놀이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루이스는 절벽 아래 추락한 에스테반의 죽음을 짐작하면서도 길을 되짚어가려 애쓰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신의 매장을 도모하는데, 아들뿐 아니라 동행이었던 레이버들에게도 공평하다. 그래서 안티고네가 숭고한 인물로 거듭났듯, 루이스는 사막을 무사히 건너 남은 이들의 새로운 길잡이가 된다.

하지만 <시라트>는 레이빙 체험에 가까운 관람을 권유하고, 사막과 협곡, 질주와 사건의 이미지에 공들이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인물들의 밀도와 깊이를 묘사하는 데에는 무심하다. ‘딸을 찾으려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아이러니가 인물 정보의 거의 전부다. 비전문 배우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준 레이버들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여행의 목적이 단계별로 동행에서 구조 요청, 생사를 건 탈출로 변모하는 동안, 그들 사이의 관계도 의심과 불신에서 위로와 연대를 거쳐, 길잡이 역할의 전복으로 이어지지만, 여전히 도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아무래도 올리버 라세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인물과 서사를 탐구하는 대신, 이미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눈치다.

<시라트>에는 두 번의 예지몽이 등장한다. 딸을 찾는 전단지를 넘겨받은 레이버는 꿈 혹은 환각을 통해 눈 앞에 펼쳐진 사막의 풍경을 본다. 그것이 루이스의 선택이라는 것은 나중에서야 드러난다. 사막에 쓰러진 루이스를 레이버들이 찾아내고, 모두 엉켜 잠든 밤. 루이스는 꿈속에서 사막의 모래를 가로지르는 평행의 금속선을 발견한다.
인생의 모든 질문과 고통이 생사의 문제를 맞닥뜨려 무력해진 다음, 이제 여행의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탈출 혹은 지연이 되었다. 그들이 탄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